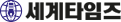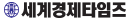[부자동네타임즈]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일으킨 바람이 태풍의 눈처럼 커지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현 정부와 정치권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인 것이다.
성 전 회장은 죽기 직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권 실세들에게 돈을 줬다고 밝혔고, 이를 적은 쪽지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2006, 2007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허태열 씨에게 각각 10만 달러와 현금 7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 3억 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억 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 원, 부산시장 2억 원 등이 적혀 있고, 금액은 없지만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 이름도 나왔다.
쪽지에 적힌 인물의 면면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실세들인데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정치자금의 전달 시기, 전달 장소, 전달 목적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쪽지의 기록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한꺼번에 부패에 연루된 우리 정치사 최대의 부패 스캔들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으로 현 정부와 여당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 돌파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썩은 곳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또 국민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만약 정치 자금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어물쩍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박근혜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하는 모든 개혁은 물 건너간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전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검찰의 책임이 무겁고 크다. 사안의 부수적 요소는 배제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 자세로 리스트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검찰력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수사에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성 전 회장은 세상을 등졌다. 하지만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를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국민이 두루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조속히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수사결과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현 상설특검법상 국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할 경우’ 특검 수사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총리,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소속 중진 의원과 시·도지사의 이름이 올라 있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이 요건에 해당한다. 사안의 성격이 이처럼 엄중하기에 검찰은 명운을 걸어야 한다. 자원외교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별개의 문제다. 권력형 범죄 의혹이 있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