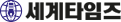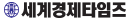야생동물 보호 위해 `합법적 사냥' 필요성 주장 논란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짐바브웨 '국민사자' 세실의 죽음을 계기로 야생동물 사냥 금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사자 등 야생동물을 살리려면 오히려 사냥을 허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아프리카에서 사냥은 복잡한 경제 효과와 관련돼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립공원 안에서의 사냥은 금지하지만, 공원내 동물의 숫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이를 공원 바깥의 사냥 농장에 팔아넘긴다.
합법적인 사냥이 허용된 농장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사자는 한마리에 2만4천 달러에서 7만1천 달러 정도의 돈을 벌어들인다.
합법 사냥으로 벌어들인 돈은 국립공원 유지와 지역사회에 흘러가지만, 사냥이 불법화하면 이 돈의 흐름이 끊기고, 인근 주민들은 밀렵과 도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아공은 1960년 전리품 사냥을 일부 농장의 규제하에 합법한 결과, 자연환경이 개선되고 하얀 코뿔소 등 위기 직전까지 갔던 일부 동물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미국에서도 제한된 사냥에 기반을 둔 자연보호 정책이 1937년 피트맨-로버트슨 법안으로 시행된 뒤 자연보호와 동물 개체수 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전 세계적인 자연보호 활동 단체인 IUCN의 로지 쿠니 의장은 "20세기에 동물의 개체수가 대거 늘어난 곳은 북미와 남아공 지역인데, 이 두 곳에서 사냥 허용은 동물 보호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사자 세실의 죽음 이후 전리품 사냥에 대한 전 세계적 공분이 확산해 항공사들이 사냥 전리품 운송을 거부하는 등 여론은 '사냥금지' 쪽으로 돌아서는 추세다.
하지만, 남아공과 함께 사냥 합법화로 인한 세금을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나미비아는 사냥 금지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악영향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들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일부 동물의 사냥을 허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한다. 또 합법화한 사냥을 위해 관광객들이 내는 돈이 지역 사회로 제대로 흘러들어 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한다.
현재 아프리카 20여개국에서는 사냥이 합법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시기, 동물의 종 등이 명시돼있다. 최대 시장인 남아공에서는 소위 '5대 동물'(사자·하얀코뿔소·코끼리·표범·물소)의 경우 사유지 농장 안에서 사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농장들의 비윤리적 운영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하지만, 사냥 합법화에도 죽는 동물의 대부분은 밀렵으로 희생된다. 특히 코뿔소의 뿔이나 코끼리 상아 등은 중국에서 선호하는 약재나 보양식 재료여서 밀렵을 통해 엄청나게 팔려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