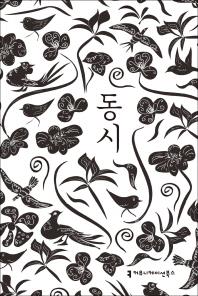
<책과 책의 만남> 잊혀지는 시에 대한 안타까움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시가 죽어버린 이곳. 따라서 삶을 여유있게 살아가는 지혜도, 남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관용도, 정작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는 혜안도 마음 한 구석에 갇혀버렸다.
더 이상 시가 잊혀져선 안된다는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득 담아낸 두 권의 신간이 눈에 띈다.
커뮤니케이션북스가 펴낸 '동시', 휴머니스트 발간 '시를 잊은 그대에게'다.
커뮤니케이션북스는 회사 내 출판 브랜드(임프린트)인 지식을 만드는 지식이 펴낸 한국근현대동시작가선집 100권에 실린 시인 113명의 작품 9천940편 가운데 30명 작가의 서른 세 작품을 추려냈다.
활자의 양을 줄이고 여백을 많이 부여한 건 독자에게 사유의 시간을 주겠다는 기획 의도에 따른 것이다.
'가시내,/기척도 없이/내 마음에 들앉더니//숫제/깃발이다,/종일토록 펄럭이는.//풍속계/얌전한 날에도/나부낀다, 고 가시내!' (송재진 '두근두근')
풋풋한 감정의 흐름이 경쾌하게도 담겼다 싶더니, 이내 아이의 장난질이 눈앞에 선해 웃음짓게 만든다.
'코딱지를 돌돌돌 말아서, 꼭꼭꼭 눌러서, 빈대떡처럼 꼭꼭꼭 눌/러서. 그래선 강아지 밥그릇에 수제비처럼 탐방 넣었어. 그랬더/니 강아지가 밥 먹다 말고 그러잖겠니./오늘은 밥이 짭짤한데. 왠지 간이 맞어.' (권영상 '강아지만 모르게')
커뮤니케이션북스 편집부는 그러나 걱정이다. 시 사이사이 백지를 두어장 끼워넣은 게 못내 독자들의 원성을 살까 두려워서다. 저질러놓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굳이 후기에서 "시인의 시는 인쇄되어 보여지고 독자의 시는 빈 종이 위에 쓰여진다"며 "빈 종이를 빠르게 넘기지 말기 바란다. 계산의 속도는 빠르지만 몽상의 속도는 느리다"고 사족 아닌 사족을 붙였다.
정재찬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의 수업방식은 특별하다. 흘러간 유행가와 가곡, 그림과 사진, 추억의 영화나 광고 등을 넘나들며 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시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한양대에선 최우수 교양 과목으로 선정된 '문화혼융의 시 읽기' 강좌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강의록을 엮어 출간됐다.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랴/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가요 '갈대의 순정' 박일남 노래)
정 교수는 사나이의 순정은 갈대에 비유하기 어렵다는 통념에서 출발해 "이 노랫말의 의미는 모호하고 아리송하다"고 운을 뗀다.
그리고는 영화 '봄날은 간다'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린다. 홀로 남겨진 주인공 상우(유지태)가 찾아간 곳은 전남 강진의 보리밭. 바다를 배경으로 낮게 깔린 보리는 넘실대는데 그는 한 가운데에서 명상하듯 선 채 미소짓는다. 정 교수는 그 장면의 배경을 갈대밭으로 기억했다고 한다. 아니 "갈대밭이어야 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왜일까? 신경림의 시 '갈대' 때문이라는 답이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조용히 울고 있었다./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까�게 몰랐다./-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그는 몰랐다. (신경림 '갈대')
정 교수는 설명한다. "인생과 운명의 법칙, 잔인할 정도로 엄정한 자연의 법칙, 그 이치를 체화하고 깨닫는 것은 비록 처절하고 허무하지만, 그것을 승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숙과 관용이 찾아온다. 슬픔을 알아야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별의 순리를 알아야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다." 깊은 밤중에 흐느껴 우는 듯한 갈대는 바로 그같은 인간의 실존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는 덧붙인다. "그러고 보면 갈대가 여자냐 남자냐 따위를 따지는 일이란 부질없는 짓이다. 자연과 운명의 법칙에 남녀가 따로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노래와 시, 영화를 넘나드는 그의 통찰은 이어진다. 시를 가까이한다는 건 바로 삶의 의미를 꿰뚫는 일이란 걸 그는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