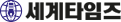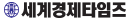"독자를 기다리지 말라" "목표는 최대한 많은 독자에게 기사를 노출하는 것"
 |
| △ 뉴욕타임스의 변화 말하는 아담 엘릭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뉴욕타임스 혁신보고소 TF팀의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활약했던 아담 엘릭이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5.5.20 ksujin@yna.co.kr |
<인터뷰> 아담 엘릭 "NYT 혁신보고서 1년…벽이 사라졌다"
'디지털-우선' 혁신보고서 TF 참여…"디지털 구독자수 100만명 돌파 눈앞" "
"독자를 기다리지 말라" "목표는 최대한 많은 독자에게 기사를 노출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뉴욕타임스(NYT)는 디지털 구독자 수 1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미국 언론사 중 가장 많다. 우리의 핵심 사업은 구독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SBS 주최로 20일 개막한 서울디지털포럼(SDF)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뉴욕타임스의 아담 엘릭 기자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만났다. 그는 뉴욕타임스의 혁신TF에 참여해 혁신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164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전통 미디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3월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암호를 충분히 해독하지 못해왔다"며 96쪽 분량의 혁신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부 공유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초기에는 혁신보고서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뉴욕타임스가 주요 경쟁자로 꼽은 언론사 가운데 하나인 버즈피드가 이 보고서를 입수해 세상에 알리며 반향을 일으켰다.
보고서는 수용자 확대와 뉴스룸 강화를 골자로 한다. 맞춤형 기사를 발굴해 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독자경험 강화, 뉴스룸 전략팀 운영, 진정한 '디지털-우선'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엘릭 기자에게 혁신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뉴욕타임스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묻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너무 많아서 그 결과물을 다 살펴볼 수조차 없다"고 답했다.
혁신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사업부와 뉴스룸이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고 한다. 사업부에도 데이터팀, 분석팀, 전략팀이 있어서 뉴욕타임스의 미래를 논의하지만, 그 자리에 뉴스룸 기자들이 앉을 의자조차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홈페이지에서 구독자에게 읽을만한 기사를 추천해주는 검색엔진 담당자의 사례도 들었다. 이 담당자가 편집국과 논의해 기사를 추천한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이들 사이에 대화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뉴스룸에 전략팀, 데이터팀, 수용자개발팀이 생겼다. 편집국에서 '디지털-우선'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사업부와 편집국 사이에 대화도 원활해졌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해야 산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혁신보고서를 둘러싸고 갈등은 없었을까.
"보고서에는 팩트, 숫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예시가 담겼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와 같은 주장은 없다. 기자라면 이런 팩트에 동의하지 않겠나?"
혁신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무엇일까. 엘릭 기자는 1천5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IS 대학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한 과정을 들려줬다.
취재 단계에서부터 수용자개발팀, 데이터분석팀, 소셜미디어팀 등 편집국에 있는 사람 8∼10명으로 팀을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다고 한다. 목표는 하나. 최대한 많은 독자에게 이 기사를 노출하는 것이었다.
이 영상은 영어와 아랍어가 동시에 나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영어 목소리가 나오면 아랍어로 자막이, 아랍어 목소리가 나오면 영어로 자막이 나오는 식이다. 아랍어권 국가와 영어권 국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존 미국 독자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를 읽지 않는 아랍권 국가의 독자를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소셜 플랫폼도 활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구당 유튜브 조회 수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에 착안해, 유튜브에 집중적으로 광고했다.
그 결과 이 영상은 지난해 가장 많이 재생된 뉴욕타임스 영상으로 꼽혔다고 엘릭 기자는 자랑스러워했다.
"2∼3년 전에 우리가 이 기사를 썼다면 송고 버튼을 누르고 나서, 독자가 알아서 찾아와 이 이야기를 읽어주길 의자에 기대앉은 채 기다리기만 했겠죠?"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