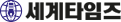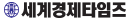|
호수공원 나무 산책』 펴낸 김윤용 작가와 함께 [고양=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5월이면 호수공원이 스무 살 생일을 맞는다. 고양신문에서는 호수공원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해 줄만한 이들과 동행하며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는 나들이를 연이어 갖기로 했다. 상대방의 장점과 매력을 알아봐주는 것이 가장 큰 축하이자 칭찬일 것 같아서다.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 『호수공원 나무 산책』이라는 책을 낸, 뒤늦게 나무와 사랑에 빠진 김윤용 작가를 모셨다.
나무책을 쓴 작가와 함께 봄꽃이 만개한 호수공원을 둘러본다는 기대를 안고 호수공원으로 향했지만, 공원에 들어서자 시기가 좀 늦었구나 싶었다. 초봄 꽃잔치의 주인공들인 산수유도, 벚꽃도, 진달래도, 개나리도 이미 져 버렸고 철쭉은 아직 봉오리를 다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우였다. 호수공원에는 자그마치 150여 종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중 봄꽃을 피우는 녀석들만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눈 여겨 보면 비로소 보이는 세계,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자기가 지닌 아름다움의 한 조각을 열어주는 봄꽃과 새순들을 만나러 호수공원을 거닐어보자. 약속장소인 폭포광장에 김윤용 작가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다. 머리에는 가는 뜨개실로 뜬 비니를 쓰고, 어깨엔 캔버스천으로 만든 에코백을 둘렀다. 첫인상이 바랑 하나 메고 바람처럼 순례하는 탁발스님 같았다고 하면 실례일까.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그가 쓴 책 제목처럼 ‘호수공원 나무 산책’을 시작한다. 폭포광장에서 출발해 시계 반대방향으로 걷기로 했다. 작가는 눈에 보이는 나무들 중 누구 하나라도 빠뜨리면 섭섭할까봐 세심히도 설명을 한다. 기자 역시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고 간단한 메모를 하느라 덩달아 바빠진다.
맨 처음 설명을 들은 나무는 풀또기였다. 이름이 독특했다. 장미과에 속하는, 분홍색 꽃을 피우는 작은 나무라서 경계수로 많이 심는단다. 잎 모양과 특징을 세심히 설명해주었지만 기자의 눈에는 나무 자체가 평범해서 특징을 잘 모르겠다. 또 만나도 알아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잔디밭 한 가운데엔 있는 침엽수는 우리나라 특산종인 구상나무다. 성탄 트리를 만들기에 딱 좋을 만큼 나무 모양이 멋지다. 이건 또 만나면 알아봐야지, 머릿속에 나무의 인상을 부지런히 입력한다.
애수교를 지나 호수교 교각을 향해 걷다보면 고양시의 시 나무인 백송이 서 있다. 흰색 바탕에 회청색 얼룩무늬가 박혀 있는, 매끈하니 윤기가 도는 듯한 나무껍질이 인상적이다. 소나무와 참나무에도 각각 여러 종류가 있고, 저마다 생김새와 특징이 다르다는 사실도 배웠다. 소나무, 곰솔, 반송은 바늘잎이 두 장인 반면 리기다 소나무는 세 장, 잣나무는 다섯장이다. 참나무는 잎의 모양을 보고 구분할 수 있단다. 어떤 녀석은 길쭉하고 톱니가 달렸고, 어떤 녀석은 넓고 잎 끝도 둥글다. 열매의 모양도 서로 다르다고 하니, 가을엔 구분하기가 더 쉬울 듯 하다. 나도 모르게 “왜 나무마다 생김새가 다 다를까요?”하고 물었더니, 김윤용 작가가 뭐 그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한마디 툭 던진다. “사람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다. 우리가 어쩌자고 다 다르게 생긴 것인지 우리들 자신도 모른다. 살아있는 생명들은 저마다 다 다르구나. 꼼꼼히 보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다.
분홍빛 벚꽃잎이 깔린 땅바닥에 떨어진 솔방울은 독일가문비나무 열매다. 침엽수는 방울같은 열매를 맺는데 이 역시 크기며 생김새가 제각각인 모양이다. 잣나무는 유독 우듬지(나무 꼭대기의 끄트머리)에만 방울열매가 달리고, 스트로브잣나무는 방울의 비늘이 쫙 벌어지며, 방크스 소나무는 반대로 잎을 꽉 다물고 있어서 저절로 벌어지는 법이 없단다. 뭔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김윤용 작가의 시선에 어떤 나무가 포착되면 어김없이 설명이 이어졌다. 손끝이 닿으면 이야기는 더 풍성해진다. 작가가 나무를 살피는 방식도 매번 달랐다. 어떤 나무는 줄기를 살피고, 어떤 나무는 새 순을 살피고, 어떤 나무는 꽃을 살폈다. 향이 좋은 꽃은 냄새를 맡아보라 하고, 무늬가 독특한 잎은 살짝 문질러 보라고 권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무를 대하는 작가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기자에게는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가짜꽃이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서양산딸나무 가지에 방긋방긋 달려있는 화사한 봉오리, 누가 봐도 꽃 모양인데, 알고 보니 꽃이 아니라 꽃을 받치는 꽃턱잎(苞葉)이란다. 진짜 꽃은 그 안에 조그맣게 숨어 있다. 벌과 나비 등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꽃을 둘러싼 꽃턱잎을 꽃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일종의 과대포장인 셈이다. 제과회사의 과대포장은 불쾌하지만, 나무의 과대포장은 신기하고 예쁘기만 하다.
화장실전시관이 가까워지자 김윤용 작가의 얼굴이 화사해진다. 자신을 처음 나무의 세계로 인도해 준 나무를 소개해 주겠다며 발길을 재촉한다. “바로 저기, 박태기나무죠.” 채 잎도 달지 않은 작은 나무가 가지마다 온통 분홍빛 꽃망울을 다닥다닥 붙이고 있다. 이런 나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다. 그 강렬한 첫인상에 김윤용 작가도 호기심이 생겨 ‘대체 이 녀석 정체가 뭐야?’ 하며 식물도감을 뒤지기 시작한 게 나무와의 깊은 연애를 시작하게 된 첫 장면이란다. 꽃을 쓰다듬는 작가의 표정이 유독 밝아진다. 일년에 한번씩 화끈하게 데이트 신청하는 첫사랑을 만났으니 그럴만도 하다. 덩어리져 붙은 꽃 모양이 밥풀떼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박태기라고 불린단다. 배고팠던 시절, 춘궁기에 피어나는 화사한 꽃을 보는 민초들의 마음이 전해오는 듯하다.
호수공원에 딱 한 그루밖에 없는 나무들도 소개받았다. 호두나무, 그리고 호두의 사촌 쯤 되는 가래나무다. 둘 다 한 구석에서 볼품없이 자라 눈길을 받지 못하는 나무였지만, 열매가 떨어지는 계절에 확인해보니 분명 호두나무였고 가래나무였단다. 그걸 확인하고는 희열을 느낄만큼 기뻤단다. 가래나무 아래에 떨어진 열매 두 알을 주워 한동안 주머니속에서 굴리기도 했다고. 온 몸 자체가 짱짱한 가시인 탱자나무 역시 호수공원에서 딱 한그루 발견된단다. 찾아가보니 큰 나무 밑둥에 세를 살 듯 뿌리를 기대고 있다. 거친 가시와 어울리잖게 희고 앙증맞은 꽃을 피웠다. 처음 눈여겨 본 탱자꽃이 참 예뻤다. 내 첫사랑 꽃나무는 이녀석으로 삼아볼까, 잠시 생각을 해 본다. 어쨌든 눈 밝고 친절한 가이드 덕분에 호사를 누린다. 작가가 몇 년동안 공을 들여 찾아 낸 호수공원의 숨은 보물들을 단 하룻동안의 동행으로 거져 얻어가는게 미안할 지경이었다.
이날 가장 멋진 시각과 후각의 공감각적 선물을 건네 준 나무는 귀룽나무였다. 아랫말산 광장에서, 그리고 반대편 전통정원 쪽 숲에서 만났다. 나무가 온통 흰색 꽃으로 덮였다. 기자가 보기에는 꽃모양이 라일락 비슷했다. 꽃 터널 아래를 지나니 머리가 취할 것만 같다. 햇살이 쏟아지고, 연초록색 새 잎과 흰색 꽃들이 반짝이고, 그 아래로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화를 신은 이들이 지나간다.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 느긋한 풍경이 또 있을까.
스무살이 된 호수공원의 공간에서 누군가는 동호인들과 마라톤을 하고, 누군가는 연인과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는 크고 작은 축제를 즐기며 추억을 남긴다. 그리고 누군가는 홀로 천천히 걸으며 나무와 꽃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평소 혼자 걷는 김윤용 작가는 다른 이에게 나무를 설명하며 걸어본 게 처음이라고 했다. 기자로서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두어 시간의 멋진 나들이를 마친 몸과 맘에 새순 같은 생기가 돋는 듯하다. 호수공원이 내 맘에 한뼘 더 들어왔다.
| ||||||||||||||||||||||||||||||||||||||||||||||||||||||||||||||||||||||||||||||||||||||||||||||||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