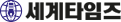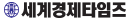면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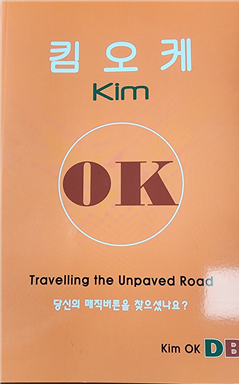
급히 의사를 불렀다. 심한 변비에 기력이 쇠약해졌다고 했다. 관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 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다. 나는 수지침을 놓는 한국 사람을 찾아갔다. 손바닥 어디에 뜸과 압봉을 놓고 붙여야 하는지를 하루 종일 배웠다.
나는 할머니에게 날마나 압봉과 쑥뜸을 해 주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시원한 변을 보는 등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침대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났다. 말수도적어졌고 얼굴색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져 갔다. 식사 양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나는 할머니가 서서히 저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하고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할머니의 병환으로 오랜만에 찾은 내 인생의 행복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한없이 좋았다. 어린 시절, 우리 엄마처럼 비린내를 풍기지도 않았고, 거칠고 가쁜 숨을 몰아쉬지 않아서더 좋았다. 불쌍한 엄마를 그리는 내 서러움을 할머니를 통해 씻어내려 했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었다.
자꾸만 작아지는 할머니를 보면서 ‘저렇게 작아지고 가벼워지면날아갈 텐데,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 큰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느낀 바로 그런 감정이었다.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땅바닥에 고꾸라지듯 쓰러져 죽은 큰오빠, 할머니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나는 할머니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할머니는 어느날, 간신히 기운을 차린 후 동부에 있는 큰아들과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는 가냘픈 소리로 집안 얘기를나누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바심이 났다. 혹 오랜 통화가 기운을 더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해서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알아듣겠니? 그 아이는 내 딸이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앞날을 챙기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다. 전화기를 놓은 후 할머니는 나를 향해 손짓했다.
“킴,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나는 할머니 곁에 바싹 붙어 앉았다. 할머니는 힘들게 다시 입을뗐다.
“넌 내 딸이다. 막내딸! 네가 우리집에 온 후로 짐도 많이 밝아지고 아주 많이 달라졌다. 킴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나는 마음이 아파서 짐짓 화제를 돌리려 했다.
“마미, 바깥 날씨가 참 좋아요. 저랑 바람 쐬러 가요.”
나는 할머니가 밖에 못 나가시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아니다. 내 남편이 보고 싶구나. 저기서 나를 부르고 있단다.
저기...... 저곳에서...... ”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오는 걸 느끼며 할머니가 보실까봐얼른 고개를 돌리며 대꾸했다.
“아직 할아버지한테 가시면 안 돼요. 저에게 영어도 더 가르쳐 주시고 제가 만들고 있는 소파 커버도 보셔야죠. 곧 봄이에요. 따뜻해지면 짐이랑 화이트락에 있는 바닷가에 가요”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았던 할머니의 병세가 더 심해진 것은 화창하던 6월의 어느날이었다. 집으로 달려온 의사는 할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모시라고 했다. 회사에 나가지 못한 짐과 내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다. 짐은 아이보리 색 바바리를 걸친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몹시 슬퍼했다.
“3년 만에 집 밖으로 모시고 나오네.”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짐이 휠체어를 갖고 오는 동안 할머니를 안고 있으면서 나는 애써 심한 변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단 결과는 대장암이었다. 그것도 말기였다. 대장에 생긴 미세한 암세포가 이미 온몸에 퍼진 상태여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샤론과 짐, 그리고 나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혹시나 걱정했던 상황이 현실로 닥칠 줄이야.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튿날이 되었다. 나는 복도에 우두커니 서서 수술실에 들어간 할머니를 생각하며 또 울었다. 수술이 끝나고 나오는 할머니는 너무나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무척 편안해 보였다. 그런데.....
“할머니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수술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1주일쯤 후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눈앞이 캄캄해 왔다. 수술 후 며칠 동안 입원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너무 동떨어진 말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않았다. 할머니가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그래도 마지막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